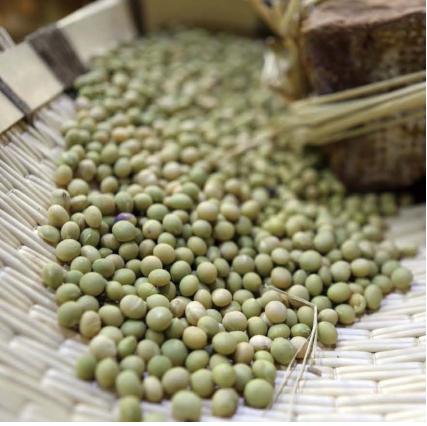페이지 정보
본문
1. 서리넝쿨콩
이름도 특이하고, 콩도 작다. 이름대로 줄기가 넝쿨로 계속 뻗어나가는 무한신육형이라고 한다. 콩 이름에 “서리”가 들어간 것을 보니 서리가 내려서야 재배가 끝나는, 늦은 만생종이거나, 껍질에 서리처럼 분이 많아서 이런 이름이 붙었을 수 있다. “넝쿨콩”은 그 것이 어떤 종류의 콩이든지 타고 올라갈 것이 있어야 하는 콩에 붙이는 이름이다.
우리나라 재래종 서리태는, 줄기가 너무 많이 자라서 제풀에 쓰러지게 되면 수확할 콩이 거의 없다는 것을 농민들은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서리태 외에도 홀애비밤콩도 마찬가지로 한 알씩 심으라는 조상들의 권고는, 3알씩 심어 줄기가 경쟁하듯 자라면 서로 엉켜 엎어져서 오히려 거둘 콩이 없다는 이야기였다. 그런데도 “서리너쿨콩” 이란 콩이 있었으니, 키워봐야 실제가 어떤지 알겠지만, 이렇게 작고 검은색의 콩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기능성 성분이 껍질부분에 많다면 콩알이 작을수록 높아지는 것일 테니 약용으로의 개발 가능성을 찾아보면 어떨까하는 것이다. 즉, 껍질속의 약성은 작고 색깔 있는 콩이 일반적인 굵은 백태보다 훨씬 높게 나올 것이고, 이와 반대로 껍질이 아닌 자엽 속에 약용 성분이 들어 있다면 콩알이 굵을수록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콩나물콩 최강 오리알태
콩나물 중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콩을 들라면 많은 분들이 토종 “오리알태”라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오리알태는 색깔이 약간 푸르스름한 것만 같을 뿐 이름이 주는 이미지와는 달리 콩알이 매우 작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오리알태”로 불리는 재래종 콩을 수집할 수 있다. 콩나물콩은 나물콩, 질금콩, 준저리콩, 유태, 수박태 등 다양하게 불려왔다. 콩알이 작고 발아율이 높아야 콩나물을 키울 때 잘 썩지 않고 수량(개체수)도 늘어나는 것이다. 콩나물 재배자에 따르면 오리알태 콩나물이 다른 콩나물콩 품종보다 다소 빨리 녹색으로 변한다고 한다.
껄꺼덕 푸르르 파르대콩 쪽내버렸다 구정물밤콩
방정맞다 준여니콩 올콜졸콩 질금콩
[『청주청원구비문학대계』의 청주시 무가에 나오는 고사덕담(종자풀이) 중에서]
콩나물콩은 민요에서 "올콩졸콩 질금콩"으로 등장한다. 올콩졸콩은 올망졸망하다는 말에서 기원했을 터이다. 자잘한 것을 뜻하니 당연 예로부터 콩나물콩은 작은 품종을 사용해왔다. 질금이란 말은 종자에서 싹이 난 상태의 식품을 말하며 엿질금(엿기름)에서 그 사용예를 찾아 볼 수도 있다.
콩나물콩의 대부분은 만생종이 아니라 중생종이 많다. 콩알이 작을수록 딱딱한 편이고 단맛도 별로 없기 때문에 밥 지을 때는 잘 사용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요즘은 압력솥 등 조리도구가 발전하여 밥밑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작은 콩의 장점은 수확기가 빠르고 수량 안정성이 대체적으로 높은 특성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작으면서도 맛있는 밥밑콩도 개발해볼 필요가 있다.

그림. 오리알태(좌). 오리알태는 콩나물콩으로 유명한 재래종이다. 일반콩(우)에 비해 매우 작은 것이 특징이다.
3. 제주도 푸른독새기콩
제주어로 “독새기”는 달걀을 말한다. 푸른독새기콩을 표준말로 풀이하면 푸른색의 달걀모양 콩이 된다. 슬로푸드 “맛의 방주”에 등재된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푸른콩은 제주도에서 <푸린독새기콩>, <푸른독색기콩> 등 다양하게 불리는데 현지에서는 그냥 <장콩>이라고 말한다. 즉, 장을 담글 때 사용되는 콩으로 껍질만 약간 파란색이다. 다른 콩에 비해 삶았을 때 단맛이 높고 찰지다. 이런 특성 때문에 된장용, 콩국수용으로 많이 이용된다. 또한 잎도 은은한 단맛이 돌아 쌈용, 절임용으로 쓴다. 】
이 콩으로 만든 장을 “제주푸른콩장”이라고 한다. 사라져가는 토종자원을 보전하면서 전통을 살려 가공식품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국내 유수의 식품·주류회사들이 원료 조달을 외국산 농산물에 주로 의존하면서 국내농산업과의 연결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세태이지만, 소멸위기의 개성있는 토종자원을 발굴하여 이를 활용해 전통적인 가공식품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더더욱 가치 있는 지속가능한 협력방법이 아닐까 싶다. 국내 메이져 화장품 업계가 토종콩을 가지고 식품업계보다도 더 창조적인 생각과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을 반면교사로 삶아볼 일이다.

6회에 걸쳐 수박 겉핥듯이 알아본 우리의 토종 콩이었다. 수천년 동안 중요한 식량작물로, 다양한 전통식품 재료로 활용되어온 우리의 콩과 식품문화가 GMO에 굴하지 말고 더더욱 다양해지고 풍요로워지기를 토종 속에서도 발굴해낼 수 있지 않을까하는 바램으로 써본 우리 콩 연재를 마친다.